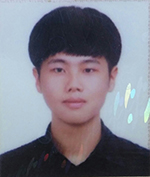
대학생 新조선통신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뒤섞여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 ‘한일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까지 많은 생각을 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나에게 9박 10일의 답사는 나에게 위의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준 여정이었다.
이번 학기 나는 학부 수업에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때 조선통신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을 듣고 과연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입장대로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 위해 파견된 문화사절단인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입장대로 쇼군의 습직을 축하하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 고민이 처음 대학생 新조선통신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9박 10일간의 여정을 통해 내가 내린 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조일전쟁 이후 200여 년의 평화 시기를 이끌었던 평화 사절단이었다. 물론 당시 대마도주의 농간이 있기는 했으나 조선과 일본 양국은 전쟁보다는 대화를, 갈등보다는 교류를 지향한 양국 노력의 결실이 바로 조선통신사였던 것이다. 실제로 1719년 통신사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은 통신을, 일본의 아메노모리 호슈는 성신을 강조했다. 양국은 전쟁으로 인한 불구대천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유적마다 통신사 관련 유물들이 굉장히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유적마다 일본 관계자분들의 열정이 넘치는 설명을 들으면서 두 번 놀랐다. 과거의 조선통신사뿐만 아니라 21세기 新조선통신사인 우리도 과거의 후한 대접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200여 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었으나 일제의 탐욕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고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민중들은 고통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다. 1945년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만 역사적 잔재들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이 부분은 미래의 역사 교사를 꿈꾸는 나로써도 관심 있는 주제였다. 이번 9박 10일의 여정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강연이 있었는데, 니시노 준야 교수의 강연이었다. 그의 강연을 통해 일본을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발전의 미래를 펼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답만을 얻은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궁금증을 낳기도 하였다. 과연 역사적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다. 양국의 평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일본이 현재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작은 역사가 한일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결코 과거의 작은 역사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으로 남아있다. 이를 어떻게 치유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미래의 역사교사를 꿈꾸는 나에게도 과제로 남을 것 같다.
9박 1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여러 답과 궁금증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남기고, 유적과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는 명제다. 9일 동안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도쿄까지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만났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역사학도로서 유물과 유적을 통한 역사공부를 지속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꿈만 같았던 9박 10일을 만들어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新조선통신사 대학생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
